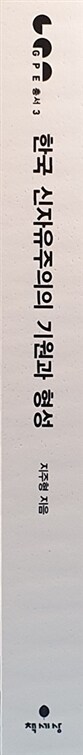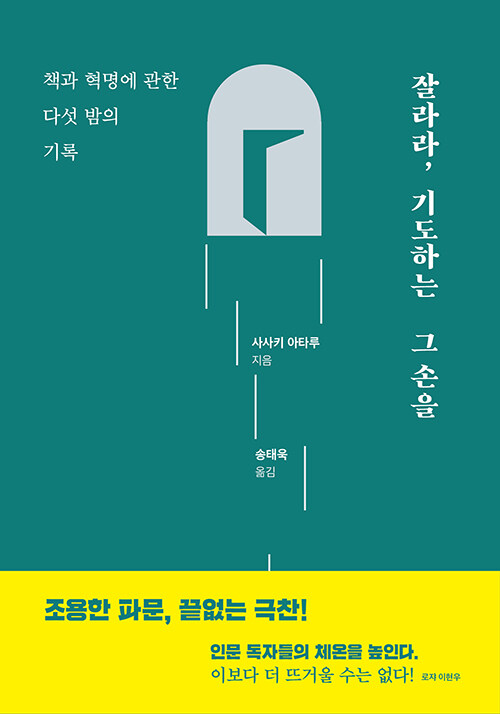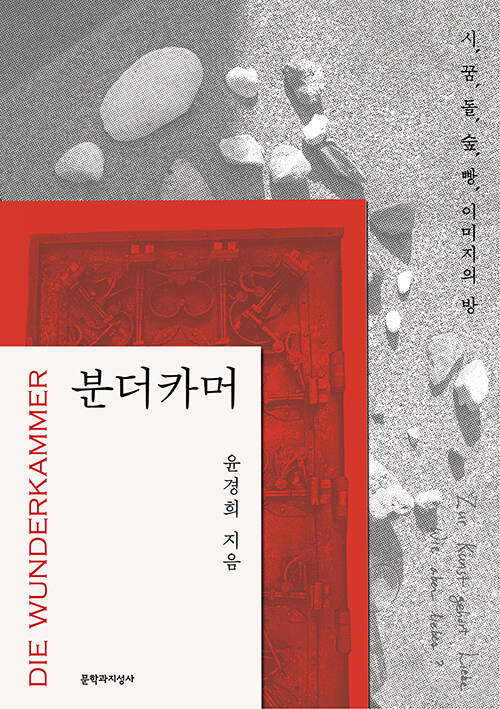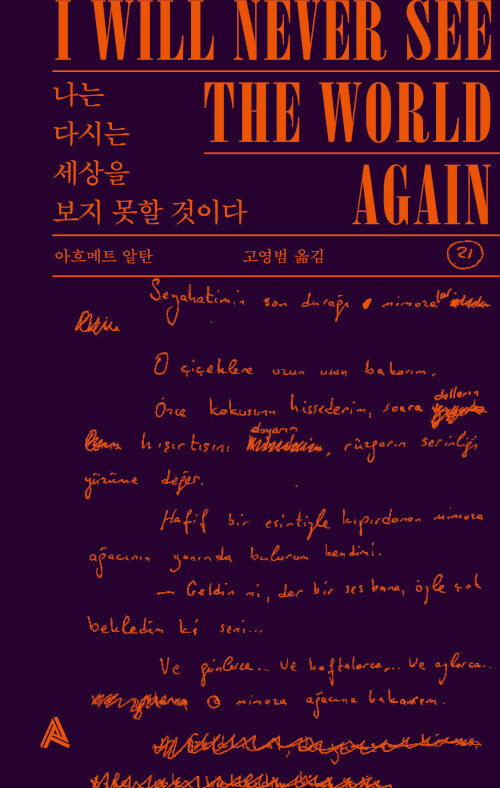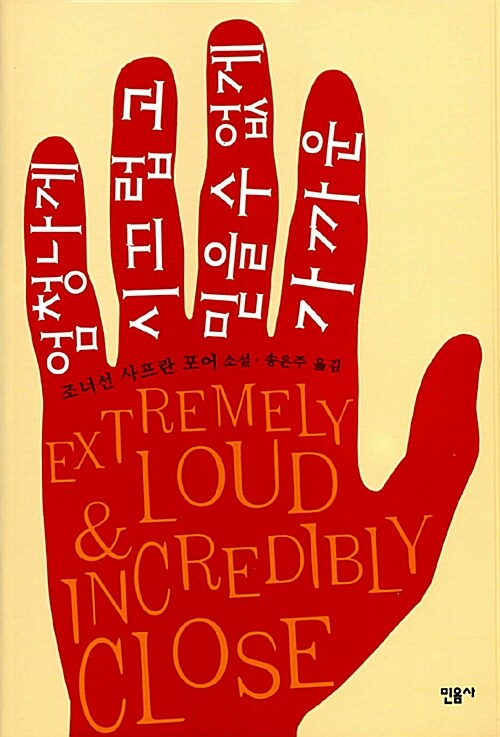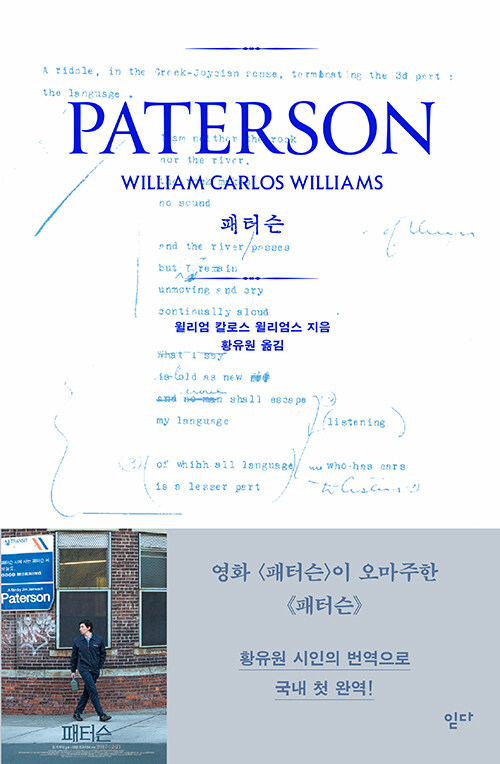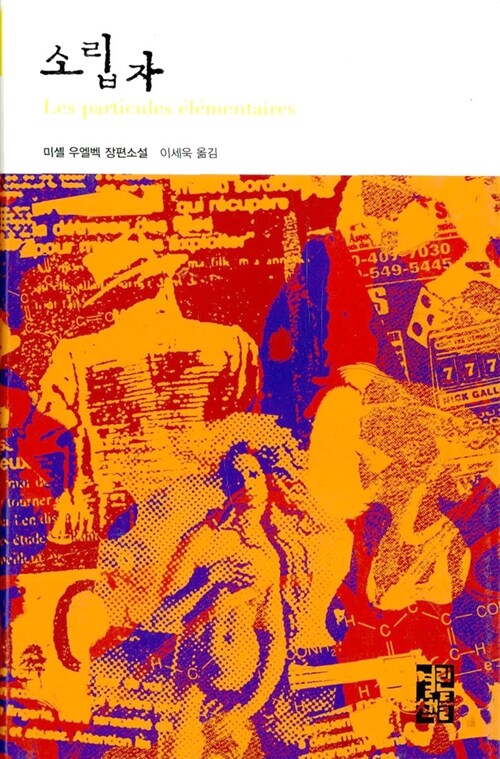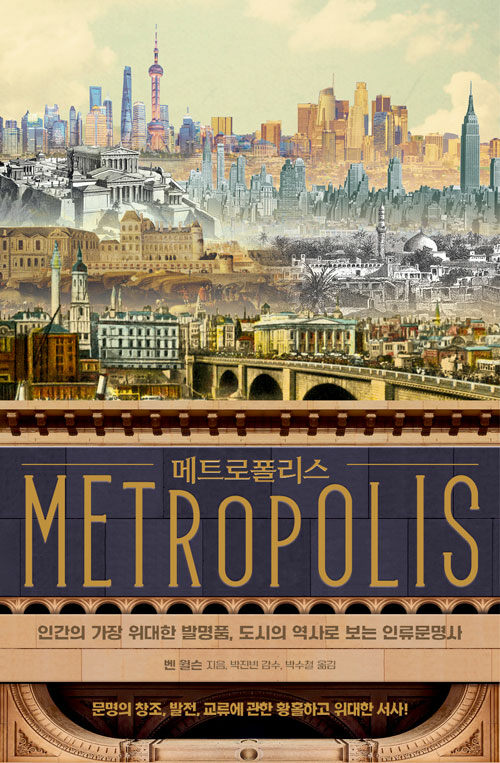성(성)을 기본값으로 ‘서구문명의 자멸’을 상징적이면서도 주도면밀하게 해부하고 있는 소설. 정치 사회 종교 과학에 대한 거침없는 냉소적 통찰은 놀라운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소설 한편으로 세기말의 모든 분위기를 웅변해 준 화제작이다. 실종된 생물학자, 미셸 제르진스키의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 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빅히스토리처럼 느껴진다. 디스토피아에 관한 놀라운 묵시록이다. 소설이 어떻게 예언이 될 수 있는지 그 섬뜩한 경험을 하게 해 준다. 우리는 이 소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작가의 세계관은 중독적이다. 우리는 소립자다.
인류 문명을 꽃피운 26개 도시로 떠나는 인문학적인 대항해가 흥미롭다. 아테네, 로마, 암스테르담, 바그다드, 런던, 파리, 뉴욕… 도시는 인류에게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하나의 도시를 생명체로 보면서 생성과 성장과 소멸, 그리고 진화를 이야기한다. 기원전 4000년, 최초로 탄생한 도시는 이후 600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예술, 그리고 폭력과 질병의 진원지였다. 우리가 도시를 닮아 가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도시가 우리를 닮아왔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도시를 만들었고, 도시를 우리를 만들었다.
김애란의 소설에는 친밀감과 반가움이 공존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읽고 났을 때 하나의 각별한 체험이 된다. 이 책은 일곱 편의 소설이 담겨있는 단편집이다. 가까이 있던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이야기 혹은, 순간 순간 다가온 상실의 이야기들이 간결하면서도 능청스러운 문체에 잘 담겨있다. “안에선 하얀 눈이 흩날리는데, 구 바깥은 온통 여름일 누군가의 시차를 상상했다”는 책의 제목을 탄생시킨 구절을 읽으며 한번도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은 한 작가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됐다. 작가의 소설에는 억지 사건이나 억지 주장이 아닌 그만의 문학적 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