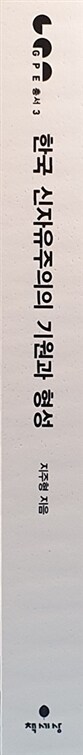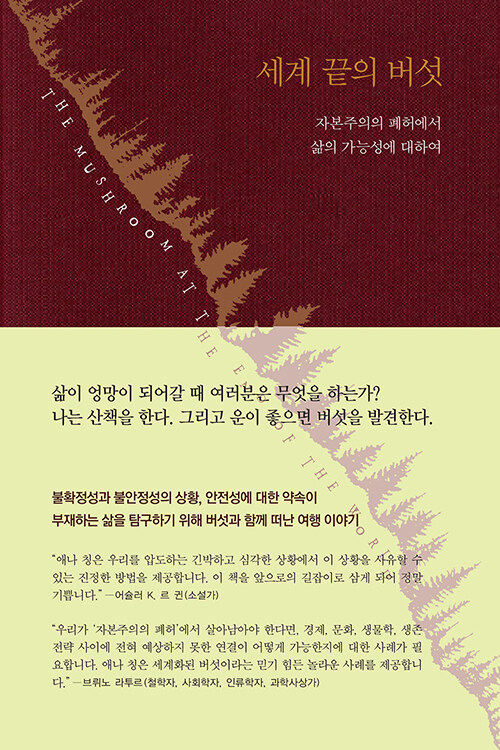21세기 최고의 책
첫 25년을 갈무리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
시적 정의마사 누스바움 지음, 박용준 옮김 | 궁리 (2024)
-
랭스로 되돌아가다디디에 에리봉 지음, 이상길 옮김 | 문학과지성사 (2021)
-
작별하지 않는다한강 지음 | 문학동네 (2021)
-
세계 끝의 버섯애나 로웬하웁트 칭 지음, 노고운 옮김 | 현실문화 (2023)
-
스피노자의 뇌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임지원 옮김, 김종성 감수 | 사이언스북스 (2007)
-
우정모리스 블랑쇼 지음, 류재화 옮김 | 그린비 (2022)
-
상황과 이야기비비언 고닉 지음, 이영아 옮김 | 마농지 (2023)
-
살과 돌리차드 세넷 지음, 임동근 옮김 | 문학동네 (2021)
-
롤랑 바르트, 마지막 강의롤랑 바르트 지음, 변광배 옮김 | 민음사 (2015)
-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지음 | 동아시아 (2017)
21세기는 인류학 연구가 빛을 발한 시기다. 불평등,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기조가 인류학 연구 분야에도 이어져 필드 연구는 전 세계적 노동 현장으로 향해 갔다. 이 책 역시 송이버섯 채취 이주 노동자들의 세계를 인류학자의 눈으로 탐구하는데, 지난 25년간 나온 인류학 책 중 가장 흥미롭다. 많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체계’ 비판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본주의 체계로 인해 자기 연구의 효용성을 비관하지만, 이 책은 그런 사회과학자들에게 체계의 빈틈을 노릴 만한 귀감이 되고 있다. 독자 역시 사회과학의 체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직접 접하며, 중국과 미국의 숲에서 버섯 향기를 맡으며 자본주의 체제로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바르트, 뒤라스, 푸코 등 프랑스의 문필가들은 자기 글쓰기의 시원으로 블랑쇼를 들곤 한다. 블랑쇼 선집이 번역된 것은 21세기 한국 출판계에서 큰 성과인데, 그중 『우정』은 바타유를 비롯한 여러 인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 저자와 인물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우정’이란 단어의 의미를 바꿔놓는다. 우정은 사귐이지만 그것은 눈맞춤이나 악수로 깊어질 수 없고, 사교활동으로 맺어질 수도 없다. 이 사귐에는 반드시 읽기와 쓰기가 개입되어야 한다. 너와 나 사이에 글이 결여되어 있다면 서로 감각도, 정서도, 지성도 자극하지 못해 우정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쓰지 않는 고급 독자’라는 말이 모순이듯이, ‘읽고 쓰지 않는 이들 간의 우정’도 아이러니다. 21세기에도 독자들은 끊임없이 블랑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럿 있다.
21세기는 회고록의 시대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 역사가 오래됐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회고록 붐이 일었다. 비비언 고닉 록산 게이를 비롯해 수많은 회고록이 있는데, 일일이 꼽기 힘들어서 회고록과 자전적 글쓰기에 대한 지침인 『상황과 이야기』를 추천한다. 비비언 고닉은 회고록계의 큰 별이고 가장 전범이 될 만한 회고록을 남겼다. 고닉은 “감정이 곧 경험”임을 자신의 여러 책을 통해 밝한다. 인간은 사실 감정을 기억에 각인하기 때문에 감정이 곧 경험이라 말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회고록은 감정-기억-경험의 인간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고대부터 당대까지, 즉 문명사적 접근은 수많은 지성인이 시도하려는 바다. 당연히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같은 책도 21세기 최고의 책 10권에 들어야 하며, 리처드 세넷의 도시 문명사를 기술한 이 책 역시 역작이다. 글은 흔히 생각하면 ‘정신’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이 책은 ‘육체’를 중심 삼아 쓰였고, 육체가 글이 될 때 글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를 입증한다. 물론 육체의 고백, 육체를 정신화한 책은 20세기에도 지배적이었지만, 세넷의 이 책은 아테네라는 아크로폴리스와 뉴욕이라는 메트로폴리스 사이의 역사를 넘나들며 살의 접촉을 가진 도시가 왜 궁극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인문출판사 글항아리 편집장.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교수신문> 기자를 거쳐 출판 편집자로 15년 넘게 일했다. 제54회 한국출판문화상 편집상을 받았고,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21>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써왔다. 지은 책으로 『읽는 직업』이 있다.